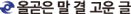15세기 훈민정음 기본자 28자는 모두 점과 직선, 동그라미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 한글은 모음자의 점(ㆍ)이 짧은 획으로 바뀌었고 4자가 안 쓰이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있지만, 훈민정음의 과학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훈민정음은 과학적인 문자이지만 과학 그 자체이기도 하다. 자연과학, 도형과학, 실용과학 모두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훈민정음이 과학적인 문자라는 것은 알지만, 이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훈민정음 과학성은 훈민정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훈민정음 과학은 일반 과학 특성 외에 쉽고 간결하다는 점이 장점이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이 과학적이라는 것은 훈민정음이 과학적 특성 곧 ‘과학성’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도 되고 문자 짜임새(체계, 구조)가 과학적이라는 의미도 된다. 국어 낱말 풀이를 가장 쉽게 했다고 정평이 나 있는 ≪보리 국어사전≫(2014년 개정판)을 찾아보니 ‘과학성’을 “과학처럼 정해진 이치와 짜임새가 있는 성질”이라고 풀이하고 낱말 쓰임새를 아예 “한글의 과학성”이라고 해 놓았다.
우리가 보통 과학이라고 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낸 보편적인 법칙이나 체계를 말한다. 과학은 객관적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고 그 결과물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보편성’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특성을 말한다.
그렇다면 ‘훈민정음은 왜 과학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해야 가장 명쾌하고도 쉽게, 누구나 공감하는 설명이 될 것인가? 대부분은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다. 해례본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므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일종의 과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므로 실제 결과물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는다. 세종은 발음 기관을 그대로 본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자음자 ‘ㄴ[니]’는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습을 본뜨기는 했지만 그대로 본뜨지는 않았다. 만일 그대로 본떴다면 ‘ㄴ[니]’는 곡선형이 되어야 하는데 훈민정음 최초 글꼴은 직선으로만 되어 있다.
따라서 훈민정음은 문자이고 글꼴이므로 먼저 도형과학으로 설명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필자는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워왔던 ‘한글음절표’를 보여준다.
일반적인 한글 음절표는 현대 한글 자음자와 모음자 차례대로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나냐너녀노뇨누뉴느니”식으로 배열한 것을 가리킨다. 필자가 개발한 한글음절표는 첫소리글자(초성자)의 경우 첫소리에서 음가가 없는 ㅇ[이]를 앞세우고 나머지는 훈민정음 해례본 방식대로 같은 자리에서 나는 자음자를 ‘ㄱㅋㄲ’ 방식으로 모아서 배열한 것이다.

가운뎃소리글자(중성자)인 모음자는 수직형 모음자를 먼저 배열하고 다음으로 수평형, 복합형 순으로 배열했다. 이렇게 한 뒤 국제용으로도 통용될 수 있도록 로마자 병기를 했다. 끝소리글자는 겹받침 포함 27자나 되는데, 누구나 인지하게 좋게 도형 중심으로 배열했다.
문자는 자음자와 모음자 전체 짜임새가 중요한데 현대 한글을 기준으로 보아도 매우 체계적임을 알 수 있다. 바둑판 같은 음절표가 생성되었다는 것 자체가 자음자와 모음자, 또는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 각각의 도형 특성과 그것이 결합된 도형 특성이 규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결합에서 중심 역할을 한 것은 모음자(중성자)인데 모음자가 수직선형 모음자와 수평선형 모음자가 황금비율로 되어 있어 이런 표 생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필자의 ≪한글학≫(2023)에서 밝혔듯이, 글자 전체로 보았을 때는 직선 중심의 도형이 과학성의 핵심 특성이 된다. 과학의 바탕은 수학인데 수학 가운데 도형 수학에 해당하는 기하학적 특성이 직선 중심의 특성이다. 훈민정음 기본 28자를 분석해 보면 직선이 78.75%이고 원형이 21.25%이다. 직선만 보면 수평선이 44.4%, 수직선이 42.9%, 사선이 12.7%이므로 수직선과 수평선이 거의 황금비율을 이루고 있다.
훈민정음의 과학은
자연과학이 바탕
도형과학 측면에서 또 다른 규칙성은 기본 상형자를 만든 뒤, 자음자의 경우는 획 더하기, 모음자의 경우는 기본자 합하기 규칙을 적용해 문자 확정 과정이 규칙적이고 그 결과가 체계적이다. 자음 기본 상형자 ㄱ, ㄴ, ㅁ, ㅅ, ㅇ의 5개 소리는 거세지 않은 소리이다. 이 소리보다 입김을 많이 내어 세게 소리를 내면 거센소리가 된다. ‘ㄱ→ㅋ, ㄴ→ㄷ→ㅌ, ㅁ→ㅂ→ㅍ’ 등과 같이 소리가 세어지는 정도에 따라 획을 더해 9자를 더 만들었다. 이 밖에도 이체자(글자의 짜임새가 다른 글자) ㆁ, ㄹ, ㅿ 3자가 더 있어 훈민정음의 기본 자음자는 모두 17자이다.
모음자의 경우는 기본 상형자( • ㅡ ㅣ)를 한 번씩 합쳐 의 네 자를 만들었다. ㅡ에 • 를 위아래로 합쳐 를 만들고, ㅣ에 • 를 바깥쪽과 안쪽에 합쳐 를 만든 것이다.
“ ”는 • 를 두 번씩 합쳐 만들었다. 자연의 이치로 보자면 아래아( • )가 위쪽과 오른쪽에 붙을 때 양성모음, 아래쪽과 왼쪽에 붙을 때 음성모음이 된다. 이렇게 한글은 최소의 문자로 기본 상형자를 만들고, 나머지는 기본 상형자에서 규칙적으로 확대해 간 문자이므로, 간결하고 배우기 쉬우며 쓰기에 편하다. 한글의 과학적 특성은 자연 철학과 연결되어 더욱 빛을 발한다.
받침으로 쓰는 종성자는 초성자를 가져다 써서 최소의 낱자로 많은 글자를 만들어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몸'과 같은 글자이다. 만약 종성자를 다른 모양으로 만들었다면 글자 수가 더욱 많아져 배우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글꼴 중심으로 과학성을 설명하다 보니 도형과학을 먼저 내세웠지만, 사실 그 바탕에는 자연과학이 깔려 있다. 훈민정음 28자는 발음과정을 분석하여 여덟 자를 기본 상형자로 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음자 다섯 자(ㄱ, ㄴ, ㅁ, ㅅ, ㅇ)는 발음기관 또는 발음하는 모양을 본떴고, 모음자 세 자(・,ㅡ,ㅣ)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떴다.
자음 기본 상형자 가운데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ㅁ[미]는 입의 모양, ㅅ[시]는 이의 모양, ㅇ[이]는 목구멍 모양을 본떴다. 이렇게 자음자는 말소리를 내는 발음 기관의 모양과 소리의 세기와 특성을 정밀하게 관찰 분석하여 만든 과학적 연구의 결과물이다.
모음 기본 상형자는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ㅡ), 사람의 서 있는 모양(ㅣ)을 본떴다. • 는 양성을, ㅡ 는 음성을, ㅣ는 중성(양음)을 뜻한다. 이렇게 만든 까닭은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는 우리말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또한 우리말 모음의 물리적 특성을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반영했다.

이렇게 자연과학 방식대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만든 뒤 이를 점과 선과 원의 도형과학으로 연결했고 이것은 다시 말소리를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실용과학으로 효과를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한글은 최소의 문자로 기본 상형자를 만들고, 나머지는 기본 상형자에서 규칙적으로 확대해 간 문자이므로, 간결하고 배우기 쉬우며 쓰기에 편하다.
자연과학과 도형과학의 융합은 실용과학으로 이어졌다. 첫째, 한글 한 글자는 하나의 소리로, 한 소리는 하나의 글자로 대부분 일치하는 실용성이다. 영어에서 'a' 글자는 여러 가지로 소리가 난다. 하지만 한글의 '아'는 '아버지’, ‘아리랑'과 같이 하나의 소리로 난다. [아] 소리는 'ㅏ' 글자로만 쓰이고, 'ㅏ' 글자는 [아] 소리로만 난다.
둘째 실용 특성은 소리와 글자가 서로 짝을 이룬다. 소리 성질과 글자 모양이 규칙적으로 서로 짝을 이룬다. 예사소리 ㄱ, ㄷ, ㅂ, ㅈ, 된소리 ㄲ, ㄸ, ㅃ, ㅉ,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이 규칙을 가지고 서로 짝이 된다.
셋째, 실용과학 특성은 모아쓰기 실용성이다. 첫소리글자, 가운뎃소리글자, 끝소리글자를 모아쓰면 가로, 세로 어느 쪽으로든 쓸 수 있고, 뜻을 드러내기에도 좋다. 그 덕분에 글자를 빨리 읽고 쓸 수 있다. 만약 ’한글‘을 ’ㅎㅏㄴㄱㅡㄹ‘과 같이 풀어썼다면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읽는 속도도 느렸을 것이다. 한글을 풀어쓸 때보다 모아쓸 때 2.5배 더 빨리 읽는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넷째, 점과 선과 동그라미만의 단순 도형만으로 똑같이 만들었는데도 자음자와 모음자가 확연히 구별되는 점도 실용과학의 진면목이다. 자판에서도 왼쪽 자음자, 오른쪽 모음자로 구별되어 배치되니, 입력이 편하고 어깨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실용과학의 극치다.
과학성과 우수성
독창성에 대한 이해
필자는 김슬옹(2012)의 “한글 우수성. 과학성. 독창성에 대한 통합 연구(≪문법교육≫ 16)”에서 훈민정음의 과학성과 우수성, 독창성을 구별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세 용어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글은 과학이고 독창적이기에 우수하다.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는 우수성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는 없다. 모든 문자는 나름의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존귀하다. 그런 맥락에서 특정 문자를 더 우수하다고 한다면 반문화적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비교에 의한 보편적 관점에서의 비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재능이 많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깔본다거나 무시하면 잘못된 것이지만 재능을 함께 나누는 것은 미덕이다. 한글의 보편적 우수성을 전 세계인과 나눠야 한다.
훈민정음 과학성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사람다움의 인문적 가치, 단순미에서 우러나오는 예술적 가치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과학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15세기에 세종대왕은 과학적인 문자를 만듦으로써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에 버금가는 문자혁명을 이뤄냈다. 서양에서 근대 이후 민주적 문자생활을 뜻하는 ‘언문일치’를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문자는 자연과학과 도형과학 실용과학이 융합되어 가능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이 글은 2023년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 최초 복간본의 필자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의 탄생과 역사≫(가온누리)를 대중용으로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