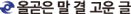공자는 사서삼경 중의 하나인 대학에서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가라는 취지에서 신독(愼獨)의 도리를 가르쳤는데, 혼탁악세를 사는 우리에겐 말 그대로 ‘공자님 말씀’이다. 그래도 공인은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 최소한 지탄받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법의 정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나 공인이나 같은 적용을 받지만 공인은 품위유지의 의무를 통해 자기검열을 하고, 이에 저촉된다면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한다는 얘기다. 자기검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인이 스스로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공인이 속한 집단의 조직적인 검열이다.
공무원 세계에는 층층이 감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부서가 있다. 성직자들도 계율과 계명을 바탕으로 자정을 요구받으며 정해진 선을 이탈할 경우 그 지위를 박탈당한다. 불교에서는 특별히 이를 치탈도첩이라고 부른다. 물론 집단의 자기검열은 오히려 조직의 불의에 반기를 든 자에게 몽둥이를 들기도 한다. 조직의 삿된 위계를 위해 검열이 악용되는 경우인데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
자기검열이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선출직인 의원들이다. 돌아가는 꼴을 보면 국회나 지방의회나 마찬가지다. 일단 정치를 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존감이 강하다. 공·사적인 자리를 가리지 않고 “내가 적임자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합리화하는데 능숙하다. 스스로에게 준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여기에다 의원들은 개인이 곧 독립기관이면서 서로 수평적 관계에 있다. 그래서인지 웬만해선 서로 건드리기를 꺼리는 것 같다. 국회나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게 돼있지만 구성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있어도 이 특위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열린다.
과거기사를 검색해 보니 도내에서도 국고보조금 횡령, 동료의원 폭행, 축제사업권 계약비리, 음주 뺑소니 등 결과가 드러난 각종 범죄부터 동남아 원정 집단성매매 의혹, 술에 취해 알몸으로 동사무소 침입한 지방의원까지 각종 추태가 잇따랐지만 윤리특위는 열리지 않았다.
2008년 동남아 연수기간 중 업소여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광경이 KBS카메라에 잡힌 충주시의회 의원들의 경우 해당 의원 4명이 윤리특위 소속이었으니 말해 무엇 하겠는가. 오직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만 기다려야하는 현실이다.
부인을 포함한 처갓집 식구들이 밀도살된 병든 소고기를 유통하고 부인이 대표인 해장국집에서 이 소고기를 이용해 13만 그릇의 해장국을 팔았다는 김성규 청주시의회 의원도 6월7일 소속정당을 탈당하고 3일 간 청가계를 내고 의정활동을 쉬는 것으로 자기검열을 마쳤다. 예상했던 대로 청주시의회도 윤리특위를 통한 조직적 검열에 나서지 않고 있다. 도매금으로 매도당한들 누구를 원망하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