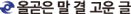<풀꿈강좌 6>박병권 한국도시생태연구소장
그가 던지는 질문은 꽤나 신선하고 요상했다. 박병권 한국도시생태연구소장은 한 번도 의심치 않았던 문화를 자연의 이야기를 통해 ‘기막힌 반전’의 재미를 선사한다. MBC느낌표 방송을 통해 ‘너구리 박사’로 알려진 그는 지난 13일 청주시 상당도서관에서 열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2010 풀꿈환경강좌’에 초대됐다.
 | ||
| ▲ 박병권 한국도시생태연구소장은 한 번도 의심치 않았던 문화를 자연의 이야기를 통해 ‘기막힌 반전’의 재미를 선사한다. MBC느낌표 방송을 통해 ‘너구리 박사’로 알려진 그는 지난 13일 청주시 상당도서관에서 열린 ‘2010 풀꿈환경강좌’에 초대됐다. | ||
충북 옥천이 고향인 박 소장은 “생물학을 전공했지만 말랑말랑한 감성으로 생태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며 “문화를 모르면 환경도 이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국 우물엔 맹꽁이가 살더라
그렇다면 ‘우물 안 개구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우물의 깊이는 대략 14m. 가장 유력한 후보인 청개구리는 유일하게 벽을 기어오를 수 있지만 10m밑에 떨어진 개구리가 생존해 있는지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2번째 후보군은 무당개구리지만 아황산가스를 싫어해 굴뚝이 가까이 있는 마을에는 살 수 없고, 마지막으로 두꺼비는 익사할 확률이 높아 생존가능성이 낮다.
박 소장은 “중국에서 수입된 한자성어가 아닌가. 중국에 가보니 우물에 대략 나무만 걸쳐 놓았는데 맹꽁이 수천마리가 들끓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우물에 있던 것은 ‘맹꽁이’일 확률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그는 이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에 대한 편견과 문화적인 상식을 방대한 이론과 실험을 통해 분석하고 뒤집어 놓는다. 실제 개구리가 우물에 살고 있는 지 떨어뜨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엑스레이를 찍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이밖에도 우리가 흔히 부르는 ‘동요’에도 허점은 가득하다고 토로한다. ‘산토끼’ 동요는 가사처럼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서 고개를 넘지 않고, 푸른 하늘 은하수는 ‘붉은 하늘 은하수’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것. “동요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문학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허황된 꿈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 생물학자의 솔직한 시선이다.
또 ‘나의문화유산답사기’를 쓴 유홍준 씨가 히트시킨 명언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한다’는 말에 대해서도 꼬집는다. “문화재관련에서는 그 말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자연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정 반대다. 아는 만큼 채집하고, 보이는 만큼 뜯어간다. 문화유적은 CCTV가 달려있고, 보존이 가능하지만 자연에는 CCTV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청주 상당산성에는 보기 드문 ‘병아리 꽃’이 있지만 일부러 가르쳐주지 않는다. 귀하다고 하면 돌아서서 캐 가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며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범띠’가 아니라 ‘호랑이띠’
박 소장은 사람들이 흔히 범띠, 호랑이띠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범띠는 ‘표범’과를 일컫는 것인데 호랑이와는 종 자체가 다르다고. 날쌔고 몸짓이 호랑이에 비해 턱없이 작은 표범(leopard)과 성격이 느긋하고 용맹하며 가장 높은 나무에서 낮잠을 즐기는 호랑이(tiger)와는 공통점 찾기가 요원하다. 따라서 ‘범띠’가 아닌 ‘호랑이띠’로 불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호수 같은 눈’, ‘사슴 같이 긴 목’등 시적인 문구에 대해 적나라한 현실을 들려줘 웃음을 자아냈다. “호수는 비가 올 때마다 쓰레기가 쌓이고 한번 쌓인 이물질은 절대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호수 같은 눈에 빠지고 싶다는 것은 썩은 물에 뛰어들고 싶다는 얘기다.” 사슴의 긴 목은 참빗으로 긁어보면 수많은 진드기와 기생충이 우글우글 거리니 이 또한 생물학적 사실을 알고 나면 결코 칭찬이 될 수 없다.
그는 단군신화에서 등장하는 ‘쑥과 마늘’에 존재에 대해서도 갸우뚱거린다. 단군신화의 기반이 해발 1500m이고, 5000년 전이라고 추정했을 때 당시 우리나라에 마늘이 보급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마늘’이 아니라 ‘두매부추’일 가능성이 높고, ‘쑥’또한 1000m이상 살 수 있는 것은 ‘맑을 대쑥’뿐이라는 것. “모든 것은 후대에 추정할 뿐이다. 다만 문학, 신화로 포장된 이야기에 과학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싶을 뿐이다. 일종의 딴지 걸기다.”
산에선 술 먹지 마라
박 소장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편견을 꼬집고, 전혀 알지 못했던 자연의 세계를 그 만의 화법으로 풀어놓았다. 그러면서 산에 가면 술을 많이 먹지 말라고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산에선 흔히 술이 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 한마디로 착각이다. 식물들은 ‘메틸알콜’을 뿜어 대화를 한다. 그런데 ‘메틸알콜’과 술을 먹을 때 발생하는 ‘에틸알콜’과는 경쟁적인 화합물이기 때문에 취하지 않게 된다. 메틸알콜로 인해 일시적인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것 뿐이다.”
따라서 산에서 앉아서 술을 마셨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메틸알콜이 날라가기 때문에 술이 확 오른다는 것. 차라리 서서 술을 마시는 편이 더 낫다고.
그는 4대강에 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강화 입구부터 창원까지 50명의 학자가 50일동안 걸어서 각각 50페이지씩 책을 썼다.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 4대강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를 2500페이지의 보고서로 묶어 청와대에 제출했는데, 결국 돌아온 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50인의 학자가 정부에서 주는 모든 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취사선택하라고 한 것인데 참 씁쓸한 정부다.”
박 소장은 요즘 스마트 폰으로 글 쓰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고 했다. 이야기 보따리가 가득한 그는 하루에도 80페이지 넘게 메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자연, 뒤집어 보는 재미’‘우리가 미처 몰랐던 뜻밖의 자연생태이야기’를 펴내면서 전국의 숲해설가들에게 지침서를 제공한 그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연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한 강의는 오히려 자연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화도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