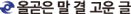김운기의 사진으로 본 충북의 어제와 오늘
1952년 38선 주변에서 남과 북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기계공고 주변 무심천 고수부지에 북쪽에서 온 피난민을 수용하는 군용천막이 들어서고 3백세대 가까운 피난민이 천막생활을 하게 됐다.
필자도 북에서 가족과 함께 내려와 이들과 함께 생활했다. 아직 열여섯밖에 안돼서인지 전쟁의 고통보다는 여름철 무심천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했던 기억이 더 생생하다.
장마가 끝나고 가뭄이 계속되면서 무심천이 말라 피난민들은 소방차가 실어다 주는 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했다. 워낙 무덥고 씻을 물이 없는 형편인지라 친구들과 함께 3km 가량 떨어진 대머리(방서동) 웅덩이를 찾아갔다.
일본인들이 사금을 캐기 위해 파놓은 웅덩이는 10여 곳이 넘었는데 큰 곳은 너비가 5m가 넘었고 깊이도 3m 정도로 고인 물은 땅속에서 솟아 차고 깨끗했다. 물깊이가 만만치 않아 수영을 할 줄 알았지만 조심스레 친구들과 새끼줄을 이용해 물 속으로 들어갔다. 물이 너무 차가와 등이 오싹한 기분이 들 정도로 피서에는 그만이었다. 가끔 농부들도 목욕을 했는데 익사자가 많다며 조심하라고 했다.
천막촌이 철거되고 몇몇 친구 가족들과 흙벽돌로 지은 모충동으로 이주를 했다. 1953년 신문사에 입사한 후 청주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56년 7월 15일 늦 장맛비가 폭우로 바뀌면서 무심천 물이 범람해 제방이 위태로워지자 경찰서 사이렌이 울리고 높은 지대로 피신하라는 가두 방송까지 더해져 청주 시내 중심가는 긴장이 고조됐다. 신문사도 작업을 중지시키고 귀가를 지시했다.
필자도 귀가하기 위해 남주동 시장을 지나 모충동으로 통하는 나무쪽다리로 향했는데 다리는 벌써 떠내려가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 쇠전(우시장) 주변 건물들도 지붕 위까지 물이 차 올랐다. 무심천 제방 곳곳에는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배치돼 제방 붕괴에 대비해 멍석과 가마니로 위험지대를 덥고 시민들 접근을 막았다.
남다리(꽃다리)쪽으로 달려가 다리를 건너는데 물이 넘쳐 겨우 건널 수 있었다. 잰걸음으로 집으로 달려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집안 주변을 살핀 후 무심천으로 내려갔을 때는 다행히 비가 그쳐 물의 양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무심천 범람은 가까스로 모면했다.
얼마 후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어 폭우로 물이 많아진 무심천 주변을 가득 메웠다.
근래 보기 드문 물난리로 수곡동 교육대학 앞 남쪽 들녘은 호수로 변했고 석교동, 서운동, 서문동 낮은 지역은 하수가 역류해 침수된 가옥들도 많았다. 당시의 무심천은 둑이 낮고 산에 나무가 없어 장마 때 떠내려온 모래가 바닥에 깔려 마치 해변의 백사장 같은 모래밭이 연출되기도 했다.
생활용수가 부족한 시절, 시내 중심가만 수돗물이 공급됐고 변두리 지역은 샘을 파거나 파이프를 땅 깊이 박아 펌프(작두샘)로 물을 퍼 올려 식수와 허드레 물로 사용했다.
장마가 끝나고 물이 맑아지면 무심천 전역은 아이들의 물놀이장이 되고 빨래하는 아낙들로 넘쳐났다. 또한 밤이 되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무심천에서 멱을 즐겼다. 모래가 깔린 냇물에는 여성은 여성대로 남정네는 남정네대로 따로 멱을 감았는데 달빛에 흐릿하게 보이는 무심천의 밤 풍경은 감탄할 만큼 황홀하기까지 했다.
청주시민의 젖줄인 무심천은 인구가 5만 시대에는 월오동 계곡을 막아 파이프로 물을 끌어오고 무심천에서 펌핑된 물을 합쳐 수돗물로 공급했는데 인구가 늘어나 제한 급수를 하면서 청원군 현도면 오가리에 취수탑을 세워 1964년부터 금강물을 끌어와 상수도 시설을 확충했다.
무심천은 해마다 봄이 되면 월오동(동막골) 골짜기에서 가재잡고 여름이면 하류 까치내에서 조개와 물고기를 잡았고 겨울이면 무심천 주변에서 아이들의 개불이쥐불이(쥐불놀이) 터로 다양하게 시민의 놀이터로 활용됐다.
인구의 증가와 함께 각종 오수와 폐수의 증가로 과거 깨끗하고 맑았던 무심천은 도시 악취의 온상이 됐고 시 당국은 이런 무심천을 방치하다가 폐수 차집관을 설치하고 대청댐 물을 퍼 올려 무심천에 방류시켜 겨우 무심천 본모습을 조금이나마 회복시켰다.
주말이나 날씨 좋은 날 무심천 주변에 가보면 많은 시민이 행복한 모습으로 가족과 함께 아니면 연인과 함께 거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벚꽃이 화사하게 필 때는 무심천은 사람들로 가득 차 엄청난 활기로 넘쳐난다.
이렇게 소중한 무심천을 우리 모두 소중히 가꾸고 시 당국 또한 힘을 기울여 좀 더 깨끗하고 맑은 무심천을 만들어 5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의 멱 감는 모습을 재연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본다. / 前 언론인·프리랜서 사진작가
필자도 북에서 가족과 함께 내려와 이들과 함께 생활했다. 아직 열여섯밖에 안돼서인지 전쟁의 고통보다는 여름철 무심천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했던 기억이 더 생생하다.
 | ||
| ▲ 아슬아슬한 징검다리 장맛비로 무심천물이 불어나 등교하는 여학생들이 돌로 놓인 징검다리 위를 조심조심 건너고 있다. / 1974년 여름 | ||
일본인들이 사금을 캐기 위해 파놓은 웅덩이는 10여 곳이 넘었는데 큰 곳은 너비가 5m가 넘었고 깊이도 3m 정도로 고인 물은 땅속에서 솟아 차고 깨끗했다. 물깊이가 만만치 않아 수영을 할 줄 알았지만 조심스레 친구들과 새끼줄을 이용해 물 속으로 들어갔다. 물이 너무 차가와 등이 오싹한 기분이 들 정도로 피서에는 그만이었다. 가끔 농부들도 목욕을 했는데 익사자가 많다며 조심하라고 했다.
천막촌이 철거되고 몇몇 친구 가족들과 흙벽돌로 지은 모충동으로 이주를 했다. 1953년 신문사에 입사한 후 청주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
| ▲ 무심천과 청주시가지 1950년대 헐벗은 산으로 장마가지면 흙, 모래가 떠내려와 무심천 바닥은 모래사장을 이루었다. 냇물건너에 쇠전과 제방둑이 보이는데 1950년대에 청주시 변두리에는 초가집들도 많았다. / 1950년대 | ||
필자도 귀가하기 위해 남주동 시장을 지나 모충동으로 통하는 나무쪽다리로 향했는데 다리는 벌써 떠내려가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 쇠전(우시장) 주변 건물들도 지붕 위까지 물이 차 올랐다. 무심천 제방 곳곳에는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배치돼 제방 붕괴에 대비해 멍석과 가마니로 위험지대를 덥고 시민들 접근을 막았다.
남다리(꽃다리)쪽으로 달려가 다리를 건너는데 물이 넘쳐 겨우 건널 수 있었다. 잰걸음으로 집으로 달려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집안 주변을 살핀 후 무심천으로 내려갔을 때는 다행히 비가 그쳐 물의 양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무심천 범람은 가까스로 모면했다.
 | ||
| ▲ 서문동이 물바다 폭우가 쏟아져 무심천물이 불어나면 배수구로 물이 차 올라 청주시 서문동과 서운동 주변은 집안방까지 물이 들어와 고충을 겪는 집이 많았다. / 1970년대 | ||
근래 보기 드문 물난리로 수곡동 교육대학 앞 남쪽 들녘은 호수로 변했고 석교동, 서운동, 서문동 낮은 지역은 하수가 역류해 침수된 가옥들도 많았다. 당시의 무심천은 둑이 낮고 산에 나무가 없어 장마 때 떠내려온 모래가 바닥에 깔려 마치 해변의 백사장 같은 모래밭이 연출되기도 했다.
생활용수가 부족한 시절, 시내 중심가만 수돗물이 공급됐고 변두리 지역은 샘을 파거나 파이프를 땅 깊이 박아 펌프(작두샘)로 물을 퍼 올려 식수와 허드레 물로 사용했다.
 | ||
| ▲ 개구쟁이 힘자랑 무심천에 장마가 끝나고나면 위쪽에서 모래가 쏟아져 내려와 무심천바닥은 모래밭을 이루어 개구쟁이들이 씨름하며 힘자랑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 1950년대 | ||
청주시민의 젖줄인 무심천은 인구가 5만 시대에는 월오동 계곡을 막아 파이프로 물을 끌어오고 무심천에서 펌핑된 물을 합쳐 수돗물로 공급했는데 인구가 늘어나 제한 급수를 하면서 청원군 현도면 오가리에 취수탑을 세워 1964년부터 금강물을 끌어와 상수도 시설을 확충했다.
무심천은 해마다 봄이 되면 월오동(동막골) 골짜기에서 가재잡고 여름이면 하류 까치내에서 조개와 물고기를 잡았고 겨울이면 무심천 주변에서 아이들의 개불이쥐불이(쥐불놀이) 터로 다양하게 시민의 놀이터로 활용됐다.
 | ||
| ▲ 냇물건너는 사람들 무심천하류 운천동, 우암동을 잇는 곳에 다리가 없어 주민들은 냇물을 자유로히 건너 다녔다. 강 건너에는 모래채취 마차가 서 있다. / 1970년대 | ||
주말이나 날씨 좋은 날 무심천 주변에 가보면 많은 시민이 행복한 모습으로 가족과 함께 아니면 연인과 함께 거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벚꽃이 화사하게 필 때는 무심천은 사람들로 가득 차 엄청난 활기로 넘쳐난다.
이렇게 소중한 무심천을 우리 모두 소중히 가꾸고 시 당국 또한 힘을 기울여 좀 더 깨끗하고 맑은 무심천을 만들어 5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의 멱 감는 모습을 재연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본다. / 前 언론인·프리랜서 사진작가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