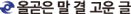청남대가 민간에게 돌아온 것은 2003년이다. 2007년 대통령 역사문화관이 문을 열었고, 2008년 하늘정원과 호반산책로가 만들어졌다. 2009년에는 자연생태관찰로가 조성되었다. 2020년에는 장교와 부사관 숙소로 쓰이던 건물이 리모델링을 거쳐 호수갤러리가 되었다. 호수갤러리는 몇 번의 기획전시를 통해 청주지역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2024년 4월 22일 이름을 호수영미술관으로 바꾸고, 개관기념으로 《김환기와 편지》전을 오는 6월 23일까지 열고 있다.

청남대 호수영미술관에서 만난
<영원의 노래>
이번에 전시된 김환기의 작품은 10여 점이고, 그가 아내 김향안에게 보낸 편지의 복제품이 나와 있다. 미술관 입구에 들어서면 제1주제인 [창가의 달과 항아리]를 만날 수 있다. 호수가 보이는 창쪽으로 김환기가 즐겨 수집하고 그렸던 달항아리가 있다. 그곳에 매화꽃이 꽂혀 있다. 그 안쪽에서 제2주제인 [환기의 정원과 식물]을 만날 수 있다. 이 공간에 정원이 꾸며져 있고, 이번 전시의 대표작 <정원 II>가 있다. 그림 속의 오브제가 달, 항아리, 꽃, 여인, 새 등이다.

이들은 김환기가 추상으로 넘어가기 전 즐겨 그렸던 자연과 세계의 형상이다. 그러나 그 형상을 단순하게 상징적으로 변형시켜 표현했다. 이러한 작품들에 그는 <영원한 것들> 또는 <영원의 노래>(제3주제) 같은 제목을 붙였다. 영원의 노래를 대표하는 작품 <새와 달>이 이곳에 있다. 두 마리 새가 달을 배경으로 날고 있다. 그 아래로 또 한 마리의 새가 선으로 표현된 산을 날고 있다.
이 새들이 그림 밖으로 나와 자개장 위를 날고 있다. 이번 전시기획의 특징이다. 그림 속 오브제를 그림 밖으로 끌어내는 시도를 선보이고 있다. 달항아리, 정원, 새가 바로 그것이다. 김환기는 “항아리의 결점을 보지 못했다. 단순한 원형이 단순한 순백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미묘하고 그렇게 불가사의한 미를 발산할 수 없다. 나로선 미에 대한 개안(開眼)이 우리 항아리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영원성을 상징하는 자연의 도상을 바탕으로 <상징도형 연작>(제4주제)이 나왔다. 선과 면으로 분할된 공간 안에 추상적인 도형을 상징적으로 그려 넣었다. 격자형 화면 속에 형태를 변형시키고 색을 실험하면서 김환기만의 개성을 만들어 나갔다. 한글과 한자를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단순한 <상징도형 연작>은 1965년부터 1967년까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려졌다. 구상에서 추상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점화도 만날 수 있다
1965년 1월 2일 일기에 “점화(點畵)가 성공할 것 같다”는 내용이 있다. 상징도형 연작을 하면서 선과 면이 점으로 변화된 것이 점화다. 1월 24일에는 “선과 점을 좀 더 밀고 가보자”고 다짐한다. 초창기 점화는 종이에 연필, 펜, 과슈, 먹으로 그려졌다. 이것이 캔버스에 유채, 코튼에 유채로 발전해 갔다. 이곳에 제5주제 <어디서 무엇이 다시 만나랴>가 있다. 이 주제는 김광섭 시인의 <저녁에>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로, 김환기의 점화를 대표하는 제목이다.
종이에 연필이나 펜으로 그린 점화는 이번 전시에 나오지 않았다. 종이에 먹으로 그린 작품 <무제>(1970) 두 점이 보인다. 아주 작은 소품이다. 초창기 실험적인 작품이다. 나머지는 종이, 캔버스, 코튼에 유채로 그린 점화다. 중간 정도 크기로 초창기 점화부터 말년의 점화까지 점화의 발전을 살펴볼 수 있다. 점화는 처음에 선과 면이 보인다. 그러다 차츰 공간과 면이 사라지고, 점으로만 자신의 생각과 주제를 표현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들 점화의 제목은 <무제>인 경우가 많다.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작품 안에 쓰여진 숫자를 보아야 한다. 3-II-68, 12-III-71 같은 숫자는 작품을 완성한 날짜를 일-월-연 순으로 표기한 것이다. 1968년 2월에는 종이에 유채 작품을 많이 한 것 같다. 2월 20일 일기에 보면 “종일 Oil on Paper를 정리하니 꼭 50점이다.”라는 글이 보이기 때문이다.
1971년 3월에는 뉴욕의 포인덱스터 화랑과 9월에 김환기 개인전을 열기로 합의한다. 3월 12일 일기에 “Oil on Paper 한 점을 하다. 한 시 정각. Poindexter 전화 오다. 9월 25일로 내 회기(會期: 개인전)를 잡았다. 반가운 소식”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그렇다면 점화 12-III-71가 포인덱스터 화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
이곳에는 우리 눈에 익숙한 점화 두 점도 보인다. 하나는 청색 점화고 다른 하나는 황색 점화다. 이들은 말년의 작품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작품들이 1973년에 많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이들 작품 왼쪽 하단에 133/200, 166/200이라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들 작품이 복제품임을 알 수 있다. 원화를 200장 복제했고, 그 중 133번째와 166번째 작품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화가 김환기(1913~1974)는 전라남도 신안군 기좌도(箕佐島) 출신이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 니혼대학 미술학부에서 공부했다. 1948년부터 1955년까지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미술과 교수를 했다. 1956년에는 미술의 본 고장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1969년까지 공부하면서 활동했다. 1959년부터 1963년까지 홍익대학교 교수로 복직해 미술대학장을 역임했다.
1963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한국대표로 참가한 다음 귀국하지 않고 뉴욕에 머물렀다. 그러므로 그의 예술세계는 살아온 장소에 따라 도쿄시대, 서울시대, 파리시대, 뉴욕시대로 나눠진다. 그리고 작품은 자연과 전통에서 출발, 추상의 세계로 나가 점화로 끝맺었다. 1950년대까지는 달과 항아리로, 1960년대부터는 색점(色點)으로 자신의 예술세계를 완성해 나갔다.

이상기 :
중심고을연구원장. 문학과 예술을 사랑한다. 독일문학을 전공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우교수를 했다. 현재 중심고을연구원장으로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 팔봉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