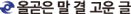송광사 ‘삼청교와 우화각’
여의주 문 용머리가 다리의 중심 축 역할…기하학적 배치에 탄복
혼백도 깨긋이 씻고 건너던
관욕의식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조계종의 본산인 전남 순천시 승주읍 송광면 송광사.
송광사 일주문을 들어서면 죽은 나무 하나가 돌무지 중앙에 서 있는 것이 보이고. 그 안으로 1칸의 작은 건물 두 채가 외면한 채 서있다. 남자의 위패를 모시는 척주각(戚珠閣)과 여자의 위패를 모시는 세월각(洗月閣)이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전용건물을 만들어 혼백을 안치한 것이 이채롭다. 이곳에서 제전에 관욕(귀신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의식이 이루어진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불국으로 행하는 선승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척주각과 세월각을 지나 송광사 경내로 들어서려면 용대가리가 홍예 중앙에 있는 무지개 돌다리를 건너야 한다. 마치 먼길 찾아 온 나그네의 걸음을 쉴 수 있게 개울을 가로지른 돌다리와 그 다리 위에 집이 한 채 덩그렇게 얹혀있다. 서양 소설속에 나오는 메디슨카운티의 지붕있는 다리와는 품격이 다르다.
그 양쪽 기둥 사이를 난간 삼아 나란히 걸쳐진 널빤지 마루에 걸터앉으면 계곡의 맑은 바람과 발 밑의 물소리에 세상의 티끌먼지가 모두 정화(淨化)되는 기분이 든다. 위를 올려다보면 탐방했던 수많은 소객(騷客)들이 써 놓은 시문이 걸려 있다. 그 가운데 해강(海崗) 김규진(金圭鎭)이 쓴 송광사(松廣寺)라는 간판이 유난히 돋보인다.
옆에는 이 다리 위에 앉아있는 집 이름인 우화각(羽化閣) 현판이 붙어있다. 우화(羽化)란 우화등선(羽化登仙) 즉, 날개가 생겨 하늘을 날아올라 신선이 된다는 뜻이니 그런 다리 위의 집이란 말이다.
물론 여기서 신선이란 금선(金仙)이니, 모든 속박을 벗어나 걸림 없이 장자재하는 해탈의 경지에 노니는 금빛 신선, 즉 부처님을 말한다.
허공으로 건너 오르는 다리
사랑도 훌훌, 미움도 훌훌, 모두다 벗어놓고 높이 높이 저 무념과 무욕의 피안으로 날아 올라가는 그런 건널목이다. 이 피안의 건널목인 우화각이 바로 무지개 돌다리(虹橋)위에 얹혀있는데 그 다리 이름이 바로 “삼청교”이다. 일명 능허교라 불리기도 한다. 모든 것을 비우고 허공으로 건너 오르는 다리라는 뜻이다. 이 반달형의 다리가 조계수에 비치면 그대로 하나의 커다란 둥근 원이 되고 그 다리 위의 우화각으로 부처님 도량을 드나드는 아름다운 선남 선녀들의 그림자가 물에 비치는 그 모습은 선경(仙境)가운데서도 가히 일품이다. 이 지리적 조건을 이렇게 절묘하게 이루어낸 옛 스님의 안목에 그저 탄복할 뿐이다.
그리고 다리 아래를 찬찬히 살펴보면 능허교의 반달 아치 가운데는 용머리가 여의주를 물고 아래에 흘러가는 물을 향해 머리를 내밀고 있는데 이것이 기하학적으로 이 다리의 중심을 기묘하게 잡아주는 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이 용머리의 여의주에는 철사 줄에 동전이 세 닢 꿰어져 있었는데 그 동전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온다. 옛날 이 능허교를 처음 만들 때 거기에 맞춰 예산을 세우고 화주를 하였는데 이 다리불사를 마치고 나니 동전 세 닢이 남았다. 이미 다리 만드는 일은 끝났고 그 남은 돈을 다른데 쓰자니 율장의 호용죄(互用罪)에 해당될 것이고, 이래저래 고심하던 끝에 그 다리 아래쪽 용머리의 여의주 끝에다 철사를 꿰어 거기에다 남은 동전 세 닢을 매달아 두었다고 한다. 그 불사를 위해 마련한 돈은 그 몫으로 써야한다는 철저한 옛 스님네들의 정신을 거기에다 꿰어둔 것이었다. 그 정신은 1977년도 지금 송광사에서 아침 저녁 울리고 있는 범종을 만들 때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그때 당시 취봉노스님께서 거금 150만원을 내 놓으셨다. 그 돈은 6.25동란 때 송광사가 대화재로 인해 많은 건물과 함께 종고루도 소실되어 중창불사를 하게 되었다. 종 불사를 위해서도 돈을 모았는데 종 불사를 마치고 돈이 남았지만 그 돈을 다른 곳에 전용(轉用)하여 쓰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었다가 그 종이 깨어져 다시 종 불사를 하게 되니 20여년이 지나 내어놓은 것이다. 어렵던 그 시절에 사중살림이 쪼들렸을 텐데 한푼도 허투로 쓰지 않고 본전과 20년 동안의 이자를 고스란히 챙겨놓으셨던 것이다. 시주자에게 그 몫으로 시주 받은 돈은 그 목적 외에 써서 안 된다는 불문율을 실천한 것이다.
요즘 세상에는 돈 없으면 일부러 명목을 붙여 일거리를 만들어 돈을 거두고는 편리하게 다른 곳에 쓰거나 챙겨버리는 일이 너무 허다하지 않은가. 우리는 저 피안의 안락 세계로 건너가는 능허교를 만들 때에 쓰고 남은 돈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마음대로 조화를 부린다는 여의주(如意珠)에 매달아 두었던 일을 깊이 새겨 볼 일이다.